검색창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힘2024년 7+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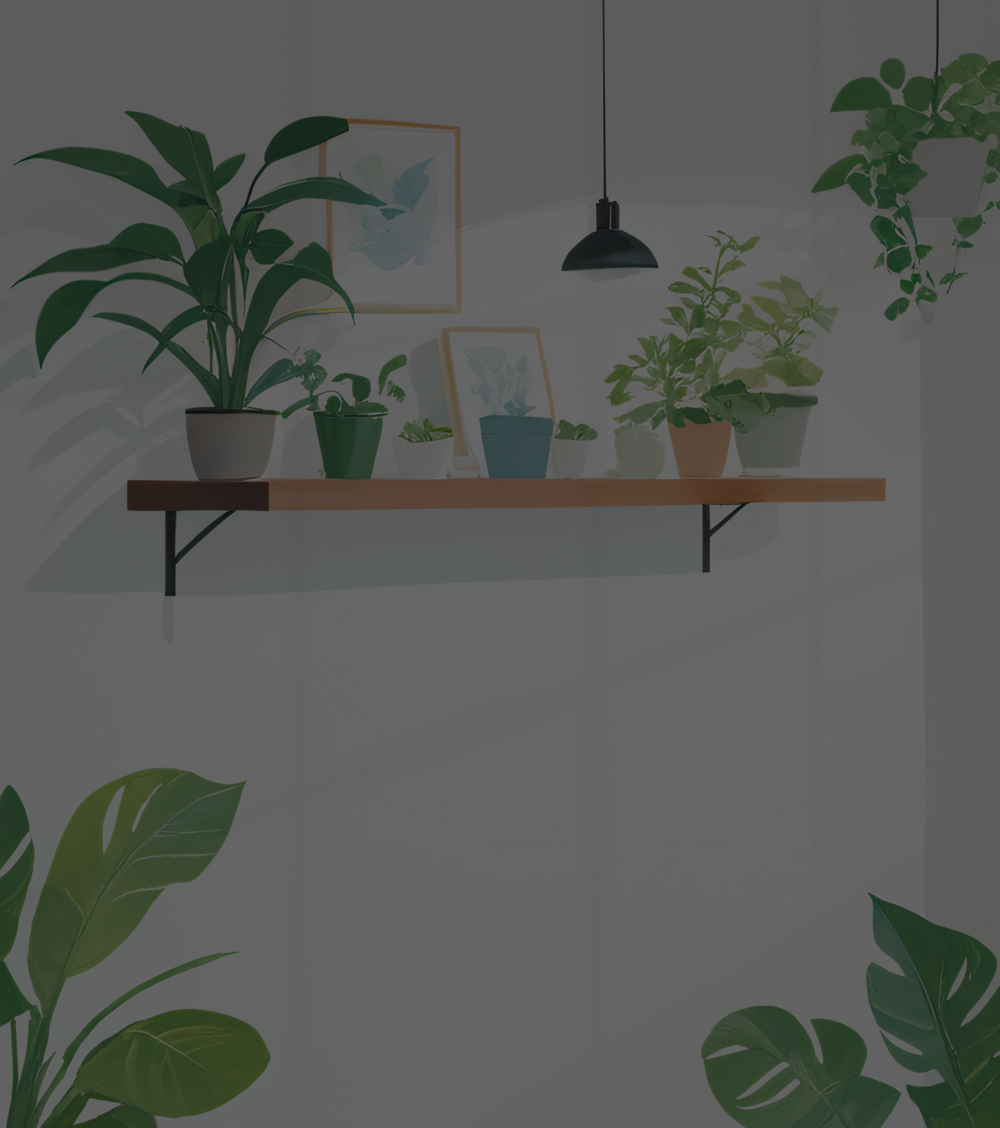
작은 정원
«유리 젠가» 저자)
언젠가부터 속이 얹힌 듯 불편했다.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삐거덕대는 관절과 함께 눈을 콕콕 찌르는 편두통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출근하면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고, 퇴근 후에 해야 할 과제와 읽어야 할 논문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었으니. 자아실현을 위해 시작한 야간 대학원이 되려 나를 옥죄고 있었다.
남들은 모두 나를 치켜세웠다. 어떻게 회사 다니면서 공부까지 해? 그들의 박수와 존경어린 눈빛에 취해있던 것도 같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한 상태였다. 입시 경쟁을 뚫고 온 대학교에서도 4년 동안 스무 개 가까운 대외활동을 하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들어갔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학업의 꿈을 찾아 나섰으니 말이다. 일명 성취에 중독된 하이에나였다.
더욱이 주변을 둘러보아도 내 또래 나이대 중 ‘갓생’을 사는 이들은 많았다. 주말 스터디 브이로그, 투잡 프로젝트 등 일상을 생산적이고 계획적인 일정으로 촘촘하게 써넣은 이들을 보면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너도나도 자기 발전에 몰두하는 상황 속, 가만히 있는 건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고, 게으르게 사는 삶 같았다. 과부하로 점철된 일상이 고통스러우면서도 나는 바쁜 삶의 끈을 쉽사리 놓지 못했다. 어느 날 집에 방문한 시어머님이 작은 선물을 가져오셨다.
“한번 키워보려무나.”
잘 자라난 허브과 식물, 레몬타임 싹을 분갈이해 곱게 담아오셨다는 그녀의 말에 나는 처음에는 얼떨떨했다. 늘 조경에 힘쓰는 시어머님과는 달리, 식물에는 문외한이었기 때문이었다. 무채색의 신혼집이 너무 투박해 보였나 싶었다. 처음에는 베란다에 두고 그저 바라만 보았는데, 화분의 어린 싹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갔다. 어두컴컴했던 마음에 빛이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레몬타임을 손 위에 두고 슬슬 문질렀더니 향이 어른거렸다. 연둣빛 잎은 햇살을 받아 반짝거리며 제 자태를 자랑했다. 나 벌써 이만큼 자라났다며 영롱하게 속삭여주었다.
당시 나는 한창 신경이 늘 곤두서있었다. 회사 후배에게 한 번 설명해 준 것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가장 싫었고, 누군가 길을 물어보려 하면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심지어 가장 소중하게 대해야 할 남편에게도 신경질적인 말부터 나갔다. 하루 중 웃고 있는 시간보다 미간을 찌푸리는 시간이 더 많았으니 말이다.
단 일분일초도 낭비하거나 손해 보고 싶지 않았다. 그러한 삶의 태도는 늘 나를 예민하고 급박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집에 들어온 초록빛의 식구로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레몬타임 옆에는 로즈메리, 테이블야자, 살구나무 친구들이 생겼다. 싱그러운 나의 작은 정원 앞에서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이 들었다. 당장 처리해야 할 일들보다 이 어린 생명들을 먹이고, 살피고, 영양을 주는 일이 더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일상 속 새로 생긴 소소한 취미는 어느덧 안식처이자 하루 중 꼭 해야 하는 나의 건강 루틴으로 변했다. 물을 주며 졸졸 소리를 듣는 일이, 분갈이해 줄 때마다 손 위를 감도는 고운 흙의 감촉이, 그 위로 올라오는 향긋한 풀 내음이 좋았다. 집에 들여놓은 식물 덕분에 나는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쉼과 안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이다. 정원 앞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니 남편의 오늘이 어땠는지, 감정을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다. 느긋한 마음을 먹으니 하던 일들도 아귀가 맞는 바퀴처럼 잘 굴러갔다.